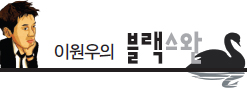
병이 생겼다. 모든 책이 ‘돈’으로 보이는 병이다. 책장에서 뽀얀 먼지를 맞으며 망각의 심연 속으로 사라진 헌 책들을 알라딘 중고서점에 팔면 책이 현금으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나에겐 의미 없는 헌 책이 누군가에게는 호기심일 수 있다. 새 주인을 만나는 게 책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한 권 두 권 내다팔던 것에 재미가 들어 지난주엔 19권을 한 방에 처분했다. 돌아오는 길엔 브런치를 먹었다.
이렇게 열심히 책들을 내다판 것에는 일말의 위기의식도 있었다. 거의 가망이 없어 보이는 헌 책도 낙서만 없으면 다 받아주는 알라딘의 마법이 그렇게 오래 지속될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 ‘있을 때 내다팔자’고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해 왔다.
“신·구간 관계없이 할인율은 15%까지만”
이제 와서는 알라딘의 중고서점이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이 든다. 중고책 거래는 적어도 당분간은 활기를 띨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정부와 업계가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도서정가제 얘기다.
지난달 25일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사 및 유통 관계자,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회의를 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가 중재한 이 회의의 안건은 도서정가제. 즉, 책의 가격정책을 논하기 위한 자리였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출간 18개월 미만의 신간도서의 경우 마일리지 적립과 쿠폰 제공 등을 합산해서 최대 19%까지만 할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용서와 초등학습참고서, 구간도서의 경우에는 무제한 할인이 가능하며 18개월 이상의 구간도 도서정가제의 예외로 적용받아 왔다.
25일 회의는 현행 도서정가제의 할인율을 조정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회의에 모인 관계자들은 신간과 구간,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관없이 책 할인율을 15% 이내로 하는 데 합의했다.
문체부는 “업계 협의가 이뤄진 만큼 공정거래위원회 등과의 정책 조정,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법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도서정가제 개정안에 이번 합의안이 반영되면 올 연말부터 15% 할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최 의원이 원래 발의한 개정안은 할인율을 10%로 정하고 있었으므로 15%의 합의안을 도출한 이번 회의는 소비자 입장에선 일보 전진(?)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시장논리에 반(反)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 제도의 취지는 침체에 빠진 출판계를 돕는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출판계는 왜 침체에 빠졌을까. 간단하다. 한국인들이 더 이상 책을 읽지 않기 때문이다.
작년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1가구당 도서구입비용은 월 1만9026원이다. 여기에는 학생들의 참고서와 취업준비생들의 수험서가 포함된다. 결국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독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읽는 사람만 읽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도서산업이 극심한 불경기라는 점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겠으나 문제는 그 대안이다. 이번 합의안대로 신·구간 모두에 가격 할인폭을 15%로 제한하면 서점들이 구간에 대해 적용하던 50~70%의 폭탄세일은 불법이 된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원래부터 책을 읽지 않던 사람들을 도서시장에서 더 멀어지게 만들 뿐더러 가격과 관계없이 책을 열심히 읽는 독자들을 처벌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셈이다.
‘안 읽는 대한민국’ … 책값 규제로 해결될까?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문화융성’이라는 키워드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다. 불경기가 고착화된 출판산업도 물론 그 대상이다. 그러나 출판산업에 대해 문체부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라 봐야 시장원리에 반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을 처벌하는 업계의 ‘담합판’을 팔짱끼고 중재해 주는 것뿐이다.
이 시점에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재호)이 발간한 ‘2013 출판산업 실태조사’는 그 충격적인 결과로 시선을 모은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된 출판사 4만6395개(2013년 6월 10일 기준) 중 실제로 출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는 7036개. 이 중에서 2012년 기준 출판 관련 매출실적이 있는 사업체는 4147개로 전체의 8.9%에 불과하다는 결론이다.
10곳 중 9곳은 간판만 걸고 있다. 그나마도 학습지 및 교육출판시장의 비중이 60%를 넘는다. 출판산업을 돕겠다는 명분으로 소비자를 처벌할 방법을 궁리할 시간에 출판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시장수요에 맞게 구조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닐까.
헌 책을 팔고 돌아오는 길, 실시간 검색창에는 ‘228 대란’이라는 검색어가 떠 있었다. 북한이 쏜 미사일 4발보다 더 큰 관심을 모은 이 검색어는 휴대폰 판매자들이 정부의 규제를 어기고 거액의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한 데서 비롯됐다. 신형 아이폰을 헐값에 살 수 있다는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은 없다.
애초에 정부가 휴대폰 보조금 지급을 규제한 데에는 나름대로의 고매한 이상과 훌륭한 목표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장의 상황은 별개로 돌아간다. 길이 없으면 길을 파는 게 시장의 생리다. 결국엔 이 넓은 세상이 자신의 의도대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한 정부만 ‘답답한 존재’가 돼 버린 거다.
도서정가제의 15% 규제는 또 다른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음모론적(的)으로 말하자면 더 이상 새 책을 서점에서 사는 사람이 바보가 될 수도 있다. 과연 이 제도가 의도대로 출판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을까? 과연 이 세상이 업계 대표들 몇 명이 담합한 대로 순순히 굴러가 줄까? 국회와 정부에 묻고 싶다. 왜 굳이 애써 ‘꼰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가? 
이원우 기자 m_bishop@naver.com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