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각과 달리, 매우 심약하고 의존적인 성격이시군요.”
‘미국 보수주의 운동사’라는 제목의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60대 초반 쯤으로 보이는 한 신사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건네는 것이었다. 이 신사는 “공산주의에서 빠져나오게 돼서 다행입니다만 결국 기독교 신자가 되셨다고요? 뭔가 의지할 것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약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라며 혀를 차는 것이었다. “젊은 시절 공산주의에 심취했으나 신(神)을 발견하면서 공산주의와 최종적으로 단절할 수 있었다”는 필자의 강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미국 보수주의와 신의 존재
특히 이 신사는 “신(神)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우익은 몰라도 보수주의자, 특히 영미식 의미에서의 철학적 보수주의자가 될 수 없다”는 필자의 말에 대해서는 적대적 태도를 보였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선생님이 보수주의란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은 ‘미국 현대 보수주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미국 현대 보수주의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우익 혹은 애국 진영에는 다양한 조류가 있습니다. 단지 오늘 제가 소개한 미국 보수주의는 신(神) 혹은 초월(transcendence)을 인정하는 철학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라고 설명했으나 이 분은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내저으며 ‘비과학적’이란 말을 되풀이 했다.
이 신사의 이야기 가운데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 나는 심약한 존재라는 사실이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다. 그러나 나 자신이 이 험한 세상을 자신의 의지만으로 극복하고 살아 갈 수 있는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솔직히 신(神)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다. 어디서 그런 대범함(?)이 나오는지? 그런데 적어도 대부분의 사람은 필자처럼 니체(Nietzsche)가 말하는 초인(superman)이 될 수 없다고 믿는다. 그리고 초인을 자처하거나 초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기 혹은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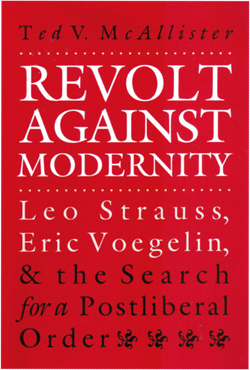
최근 끼고 다닌 책은 테드 맥알리스터(Ted McAllister)의 <근대성에 대한 반란>(Revolt Aganist Modernity)이다. 이 책을 구입해서 처음 읽은 지는 제법 됐다. 흔히 현대 미국의 ‘철학적 보수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필독서로 다음의 5권의 책을 꼽는다. 1)리차드 위버(Richard Weaver)의 <이념은 결과를 가진다>(Ideas Have Consequences) 2)레오 스트라우스(Leo Strauss)의 <자연권과 역사>(Natural Right and History) 3)에릭 푀겔린(Eric Voegelin)의 <정치학의 새로운 과학>(New Science of Politics) 4)러셀 커크(Russell Kirk)의 <보수주의 마인드>(The Conservative Mind) 5)로버트 니스베트(Robert Nisbet)의 <공동체를 향한 탐구>(The Quest for Community) 등이다.
이 가운데 리처드 위버나 러셀 커크는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적어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 그리고 로버트 니스베트도 그렇게 난공불락은 아니었다. 그러나 레오 스트라우스와 에릭 푀겔린은 쉽지 않았다. 그나마 다행히도 앞에 언급된 <자연권과 역사>, 그리고 <정치학의 새로운 과학>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쉬운 책이었다.
이 두 철학자의 다른 책들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단편적으로만 와 닿을 뿐 전반적인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추천받은 책이 맥알리스터의 <근대성에 대한 반란>이었다. 이 책을 다시 펼치게 된 것은 앞의 강연, 그리고 최근에 벌어진 문창극 총리 후보 논란 때문이다.

현대성의 반란으로 나타난 ‘포스트리버럴’
이 책은 현대에 반란을 일으킨 2명의 철학자에 관한 책이다. 스트라우스와 푀겔린 두 철학자는 미국 현대 리버럴리즘(liberalism)을 현대성(modernity)의 일부로 간주하고 ‘포스트리버럴 질서’(postliberal oder)를 추구한다. ‘포스트리버럴 질서’란 기본적 자유주의 원칙에 헌신적이면서 이 자유주의 원칙들이 규범적 질서(normative order)를 반영하고 있다는 믿음에 의해 보강된 질서이다.
맥알리스터의 책은 성경에 나오는 이브(Eve)와 욥(Job)의 이야기로 출발한다. 이브는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다. 이 금단의 열매는 ‘지식의 힘’을 의미하는 것이며 인간의 의지로 신의 의지를 대체할 수 있다는 믿음을 상징한다. 반면 욥은 가장 기본적인 공정(fairness)과 정의(justice)에 대한 인간의 개념을 침해한 신(神)을 이해하려 했다. 즉 신의 계획 하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받아들인 것이다. 여기서 현대인(moderns)은 이브와 같다. ‘지식의 구속적 힘’(redemptive power of knowledge)을 신봉하며 미스터리(mistery)와 불확실성(uncertainty)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그러나 곧 정복될) 미개척지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현대성의 출발은 계몽주의 운동(Enlightenment)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계몽주의 운동은 이성(reason)의 중요성을 알리고 개인(individual)의 올바른 지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러한 계몽주의적 영향 하에서 19세기 영국의 자유주의(Liberalism)가 꽃피우게 된다. 그러나 이성에 대한 과도한 믿음과 개인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공공 철학의 상실’(the loss of public philosophy)로 이어지게 된다. 즉 ‘의문을 품을 수 없는 도덕적이고 신성한 구속력’(an unquestionable moral and divine sanction)이 도전을 받게 된 것이다.
인간의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은 그동안 자연권(natural right)으로 간주됐다. 증명을 할 필요가 없는 당연한 권리였고 또 의문을 품어서도 안 되는 신이 부여한 권리인 것이다. 그러나 신성불가침의 영역은 현대인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19세기 말부터 시작, 20세기에 들어와 이러한 신성불가침의 영역은 여지없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니체는 선언했다. “신은 죽었노라”고.
이와 같이 신의 자리를 과학(science)이 대체하기 시작한 것이 ‘현대성’(modernity)이다. 19세기 말만 하더라도 ‘진보의 시대’였다. 과학적 합리성으로 무장한 인간이 정복하지 못할 영역은 없어 보였다. 새로운 인류가 이 지구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도 시간 문제인 것처럼 보였다. 이성과 과학의 폭주가 시작된 것이다. 현대성을 대표하는 정치사상은 3가지로 나타났다.
첫째가 나치즘, 둘째가 공산주의, 셋째가 리버럴리즘이다. 그리고 현대성에 대한 비판은 나치즘과 공산주의가 보여준 전체주의 모습에서 시작됐다. 나치즘은 히틀러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으며 홀로코스트(Holocaust)는 ‘적법한 국가의 합법적 운용’(a legal operation of a legitimate state)이었다. 신으로부터(혹은 도덕으로부터) 독립한 강한 개인을 추구했으나 정작 만들어진 것은 소외감과 고독에 몸부림치는 대중(mass)이었다. 이 대중들은 주체적이지도, 자발적이지도 않았다. 이들은 자유를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부터 도피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대중을 정치적으로 조직한 것이 나치즘과 볼셰비즘이다. 나치와 볼셰비키는 ‘탈도덕화된 국가’(de-moralized state)를 건설했다. 이들에게 과학이란 흉기였다.

현대성의 위기, 이성과 과학의 폭주
현대 서구사회는 이러한 나치즘과 공산주의의 위험을 극복해냈다. 그러나 ‘현대성의 위기’는 서구 리버럴리즘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더 이상 무엇이 옳고 그른지(what is right and wrong)를 알지 못하게 됐다. 실증주의(positivism), 역사주의(historicism) 그리고 상대주의(relativism)로 무장된 현대 리버럴들은 삶의 의미에 대해서 말할 수 없게 됐다. 이들이 추구한 ‘현대성’의 결론(conclusion) 혹은 종말(end)은 ‘방향상실’(disorientation)이었다.
실증주의는 객관적이란 이름하에 자연과학적 방법론에 맹목적으로 매달리면서 ‘가치로부터 자유로운’(value free) 사회과학을 만들어내려 했다. 그러나 이러한 실증주의는 모든 ‘비현상적 현실’(nonphenomenal reality)에 눈감아 버림으로써 인간의 삶의 의미에 답할 수 없게 된다. 이들에게 인간은 목적이 아니라 연구 대상 혹은 수단일 뿐이다. 마치 플라톤(Plato)의 동굴 우화에 나오는 사람들이 동굴 속에 앉아서 보이지 않는 동굴 밖의 세상에 대해 보이지 않으니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 짓는 것과 같은 태도였다.
또 역사주의는 모든 역사적 사실은 역사적 반영(혹은 현상)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얼핏 보면 그럴 듯하다. 하지만 역사주의도 역사적 현상의 하나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들은 역사의 의미 혹은 역사상의 절대적 진리를 부정한다. 또 문명(civilization)은 창조된 형이상학적 경계(metaphysical boundaries) 속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주의와 결합된 상대주의는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 주장하며 진리(truth)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해 버린다. 현대 리버럴리즘은 자유를 추구했으나 그 자유의 근거가 되던 자연권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정치철학으로 전환돼 버린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위기’가 나타나며 그 전형이었던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은 나치즘에게 저항다운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권력을 내줬던 것이다.
현대성은 신을 죽였다. 그러나 신을 대체해서 ‘삶을 부여할’(life-giving) 그 무엇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아니 이러한 신 혹은 초월적 존재의 자리를 대체하고 들어선 것이 ‘이데올로기적 광기’(ideological madness)이다. 이성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병든 영혼들’(diseased souls)은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확실성(certainty)을 찾고자 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았다. 그것이 바로 나치즘과 볼셰비즘의 등장이었다. 일단 외양상으로 현대 리버럴리즘은 나치즘과 볼셰비즘에 대해 승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19세기 고전적 리버럴리즘의 건강성을 상실한 현대 리버럴리즘은 스스로 ‘가치 판단’을 포기함으로써 상대주의적 자기 분열 위기에 빠지고 있거나 혹은 방법만 점진적일 뿐 볼셰비즘이 추구하는 최종목표와 함께 함으로써 내용적으로 볼셰비즘에 흡수·이용당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인간의 힘과 존엄(dignity)을 숭배하는 새로운 ‘정치적 종교’(political religion)가 됐고 이 새로운 인본주의적 종교의 ‘창조자-인간’(the creator-human)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할 힘을 상실한 채 권력의 의지(will to power)를 추구하거나 초인(superman)을 기다리는 존재가 됐다.
고전의 회복과 존재론적 신비주의
레오 스트라우스와 에릭 푀겔린은 현대성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조류에 역행하는 정치철학을 추구했다. 스트라우스는 고대(Ancient)의 고전(Classic)의 회복을 주창했다. 그리고 푀겔린은 ‘존재론적 신비주의자’(ontological mystics)를 자처했다. 푀겔린에게 역사란 “신이 이야기해 준 이야기”(a story told by God)이다. 객관과 주관의 영역은 실증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역사에서는 더 그러하다. 따라서 역사관이란 역사를 바라보는 안경과 같은 존재이다. 이러한 안경 없이 역사를 본다는 것은 역사를 목적(purpose)과 의미(meaning)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행위이다.
철학적 보수주의는 자유주의의 원칙을 소중하게 여긴다. 오히려 자유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현대성’(pre-modernity)을 보존(conserve)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렇지 않고 자유주의적 현대성 전체를 버려야 한다는 사람은 보수주의자가 아니라 반동주의자(reactionary)일 것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남는다. 보존해야 할 것이 없게 된다면? 그렇다면 철학적 보수주의자는 ‘혁명적 반동주의자’(revolutionary reactionary)로 전화돼야 할지도 모른다. 
황성준 편집위원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